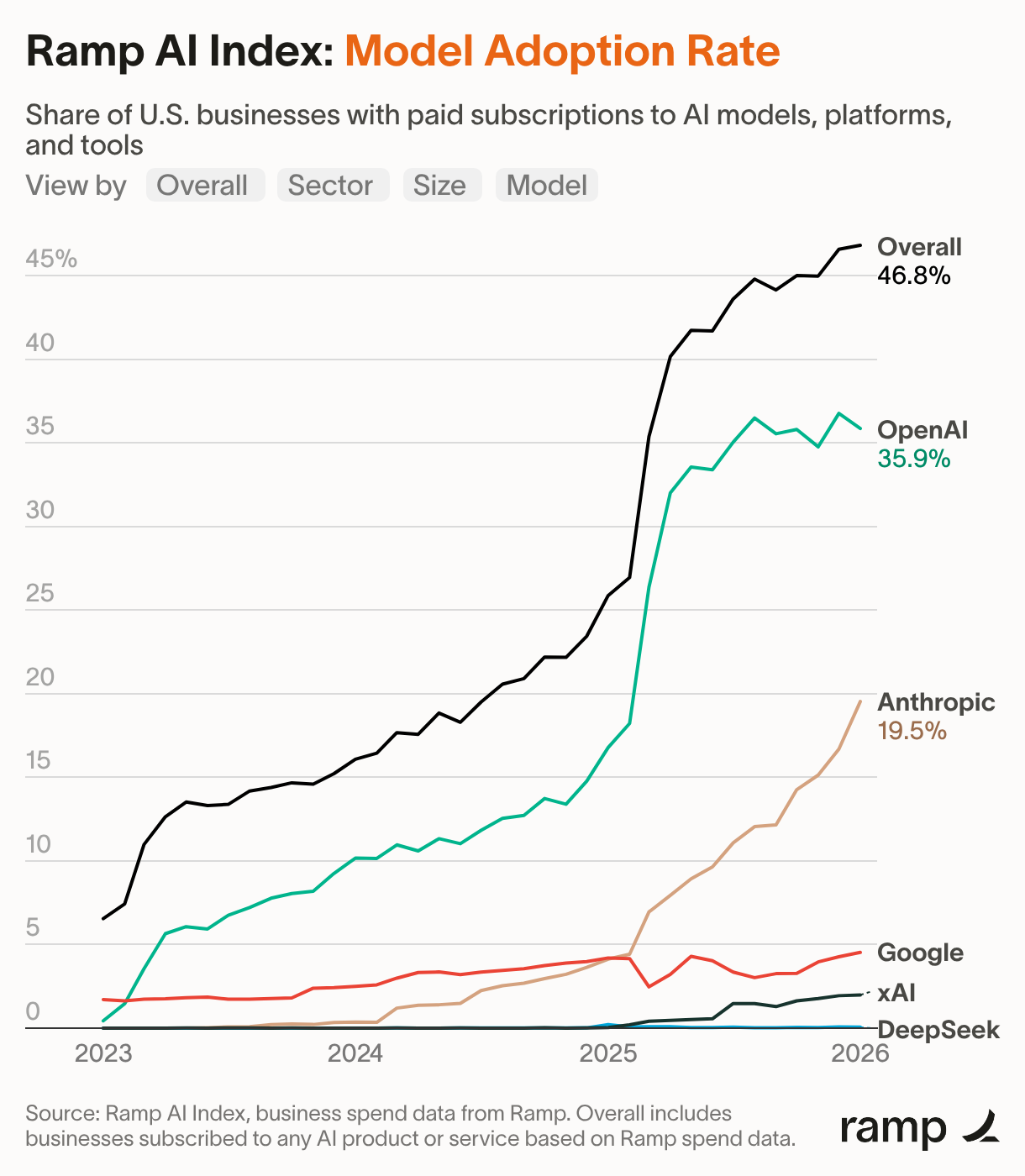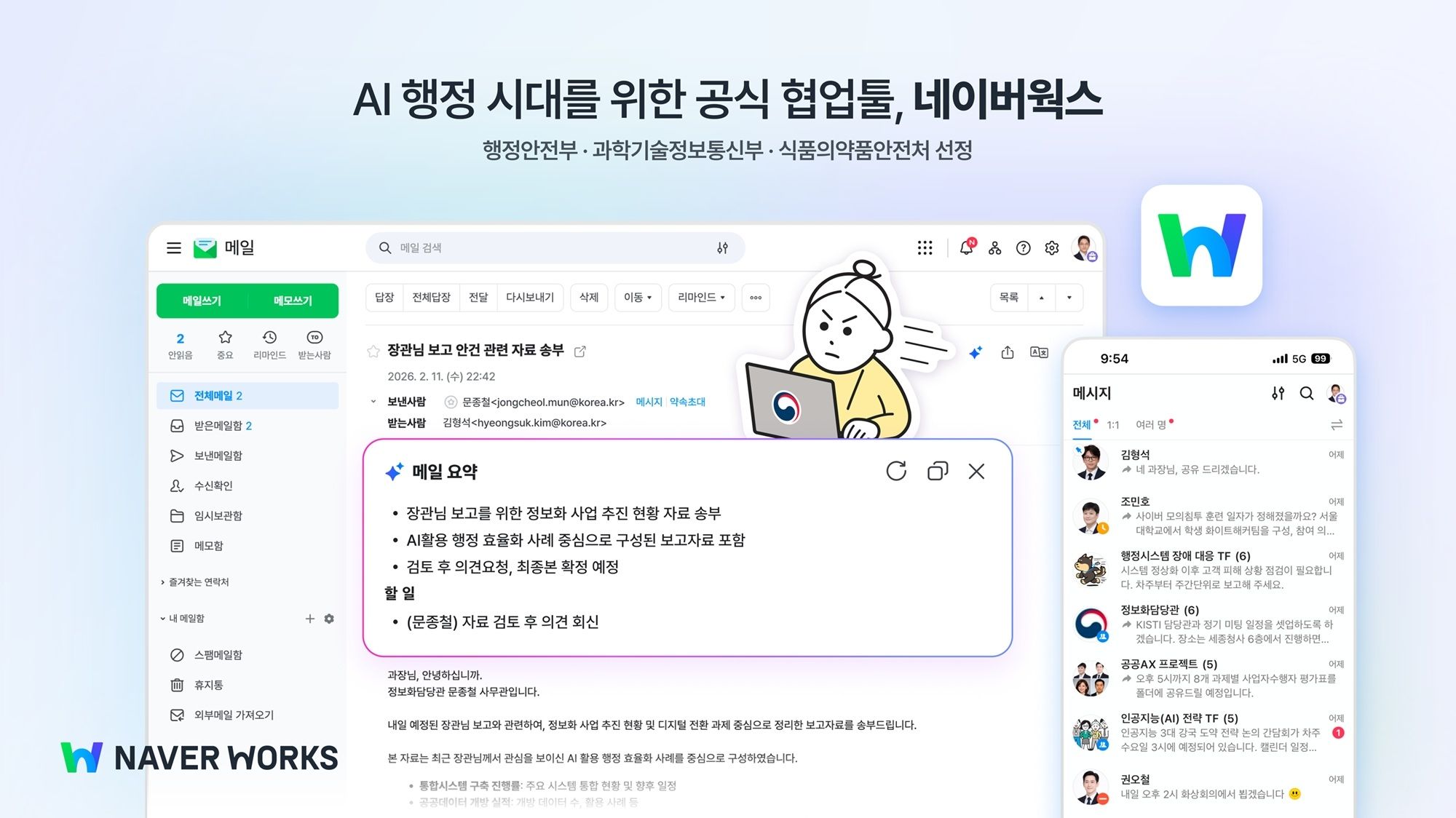[IT수다떨기] 스타트업 해외 전시, 기업 수는 반으로 줄이고 육성 프로그램은 두 배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테크수다 기자 도안구 eyeball@techsuda.com] 2026년에도 CES에 왔다. 전시장을 가득 메운 한국관의 규모는 외형적으로 대단한 국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스타트업 지원과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목표 아래, 지원기관들의 KPI는 어느 정도 채워진 듯하다. 나도 양이 질을 만든다고 믿는다. 많은 시도가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것도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접근법, 즉 질적 성장을 위한 2.0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아마 2027년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CES 전시 공간 예약은 행사가 끝나가는 목요일이나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결정된다. 선거도 있으니 참여 기관들은 규모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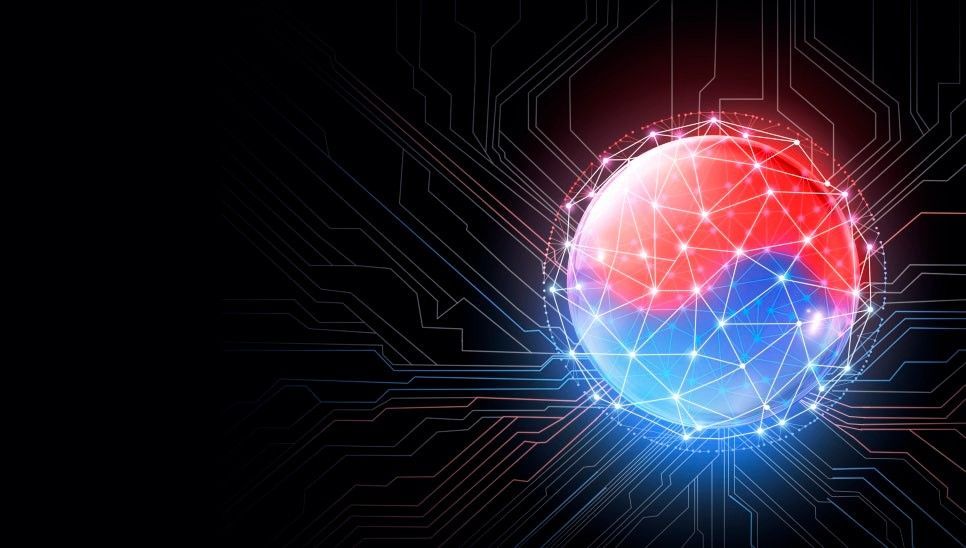
준비 안 된 기업들이 너무 많다
한국관에는 해외 진출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이 정말 많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문제도 있고,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태도나 역량의 편차도 크다. 이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대안이 필요하다.
내 제안은 이렇다. 전시관 부스 참여는 반으로 줄이되, 참관 인력은 그 예산으로 대폭 늘리자. 해외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육성 프로그램에 더 투자해야 한다.
전시 공간을 지키다 보면 정작 다른 나라, 다른 아이템을 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공략하려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과제로 주고, 귀국 후 서로 공유하면서 다음 준비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떨까. 이미 성공적으로 진출한 선배 기업들의 도전 과정을 깊이 조사하는 것도 좋은 학습이 될 것이다.
컨퍼런스가 진짜 알짜다
컨퍼런스 장에서는 엄청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그게 진짜 핵심이다. CES Daily 소식지 뒷면에는 주제와 일정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 어떤 주제로 어떤 연사가 나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두 파악하고 기록해야 한다. STT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원문을 구해 정리하는 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영어를 못해도 가능하다. 나 같은 사람도 다니는데, 여기 온 이들은 나보다 100배는 뛰어나다고 자신한다.
공간 디자인 전문가들에게도 이 넓은 전시장은 배움의 현장이다. 어떤 컨셉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해당 전시장을 디자인한 전문가들을 만나 조도, 색감, 카펫 종류와 밀도 등을 배울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는 프라이빗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입구부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연출, 전체 공간에 펼쳐진 제품들, 그 안에서도 프라이빗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디테일까지. 기술을 제쳐두고라도 1년 내내 준비한 이들의 노력을 엿보고 듣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선수들 아닌가. 이런 노하우가 더 많이, 더 넓게 공유되면 좋겠다. LG전자도 마찬가지다.
각국 스타트업 지원센터장들과의 인터뷰, 개별 스타트업 조사도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우리는 CES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유사한 행사들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
학교마다 많은 인원을 보내는데, 주제별로 조사 과제를 주고 가장 우수한 학교와 학생들에게는 상금을 주고 다음해 재참가, MWC 지원, 일본 스시테크 참가 등의 특전을 주면 어떨까. 특히 중국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 전시 참가 조사 기회도 제공하면 좋겠다.
기업들처럼 치열하게
기사를 쓰려면 취재를 해야 한다. 만나고 듣고 시장을 조사한다. 기업도 기사를 안 쓸 뿐, 같은 일을 한다. 삼성전자 신제품을 보며 10분 넘게 사진을 찍는 사람을 봤다. 촬영을 막아놨는데도 틈을 노려 경쟁사를 분석하는 치열한 이들이 있다. 생존을 위해 그런다. 스타트업도 기업이다. 더 치열해야 하지 않을까.
제대로 된 투자가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 써야 한다.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때다.
계속 해오던 방식은 생성형 AI와 로봇의 결합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아직 이틀이 남았지만, 장밋빛 기대보다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더욱 느낀 하루였다.
테크가 전 산업 영역에 스며드는 소식에 관심이 많다. 1999년 정보시대 PCWEEK 테크 전문지 기자로 입문한 후 월간 텔레닷컴, 인터넷 미디어 블로터닷넷 창간 멤버로 활동했다. 개발자 잡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편집장을 거쳐 테크수다를 창간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태블릿을 가지고 얼굴이 꽉 찬 방송,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 라이브를 한국 최초로 진행했다.
.jpg)